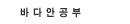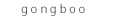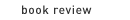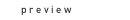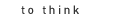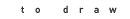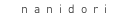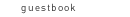3권은 몽테뉴의 평생 단 한번뿐이었던 유럽 여행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여행기의 기록들과 에세의 인용도 점점 많아지고 첫 출간부터 마지막 증보개정판을 내기까지 몽테뉴의 사상과 철학이 어떻게 변화해나갔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논평한다. 막바지에 접어든 종교전쟁과 함께 몽테뉴의 사색도 더욱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몽테뉴답게 무르익어간다. 절제와 금욕의 스토아철학으로부터 '가장 솔직한 것, 즉 가장 인간적이고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p.321)으로 진행한다. 중세 서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던 이분법적 철학, 인간의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현실과 일상까지 지배하던 종교적 가치에서 해방된 진정한 인문주의자, 르네상스적 인간이 탄생한다.
이 책을 읽지 않고 몽테뉴의 에세를 읽었더라면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는 커녕, 내용의 밑바닥에 숨겨진 몽테뉴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시대적 상황을 모른 채로는 아마 100페이지도 읽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에세를 사놓고 50페이지도 못 읽고 덮어둔 상황이었다.) 몽테뉴의 에세를
이 책을 읽지 않고 몽테뉴의 에세를 읽었더라면 그 내용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는 커녕, 내용의 밑바닥에 숨겨진 몽테뉴 자신의 개인적 경험과 시대적 상황을 모른 채로는 아마 100페이지도 읽어낼 수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에세를 사놓고 50페이지도 못 읽고 덮어둔 상황이었다.) 몽테뉴의 에세를
무거운 철학책으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 에세이의 시초라는 이야기에 가벼운 신변잡기로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담긴 인간에 대한 통찰이 참으로 묵직하다. 음미하고 사색하며 두고두고 읽어야 할 고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직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다. 홋타 요시에의 풍부하고 깊이 있는 연구 덕분에 몽테뉴에 대해 정말 잘 알게 된 것 같은 착각이 든다. 자주 만나 속깊은 이야기를 털어놓는 가까운 친구처럼 말이다.(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정작 몽테뉴의 <에세>는 지금 당장 읽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는다. 천천히 읽지 뭐~ 하고 여유있게(?) 생각하고 있다. ㅎㅎ )
좁은 의미의 철학이란, 또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란 경험론적이거나 합리론적인 것의 구분을 넘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 그 자체에 대해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학문활동이라고 한다면, 몽테뉴를 그런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철학자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몽테뉴씨를 보는 것처럼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회의주의자라는 그럴듯한 호칭도 왠지 그를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몽테뉴씨는 몽테뉴씨다. 그리고 홋타씨도 그저 홋타씨다. 이 두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겐 그저 행운이다.
좁은 의미의 철학이란, 또는 학문으로서의 철학이란 경험론적이거나 합리론적인 것의 구분을 넘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과 인간 그 자체에 대해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찾고 체계를 세우고자 하는 학문활동이라고 한다면, 몽테뉴를 그런 철학의 영역에 들어가는 철학자라고 하기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은 몽테뉴씨를 보는 것처럼 어딘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 회의주의자라는 그럴듯한 호칭도 왠지 그를 제대로 표현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몽테뉴씨는 몽테뉴씨다. 그리고 홋타씨도 그저 홋타씨다. 이 두 사람을 알게 된 것이 나에겐 그저 행운이다.

분류 : 북리뷰 2009. 10. 19.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