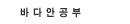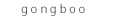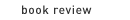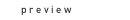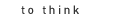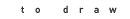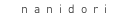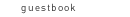황금가지로 시작한 1월은 곧 레비스트로스를 탐독하며 보내게 되었다. 황금가지는 결국 3분의 1도 채 읽지 못하고 말았는데, 변명같지만 아무래도 책을 잘못 선택한 듯 싶다. 내가 고른 책은 을유문화사의 맥밀런판이었는데 욕심에 제일 분량이 많은 책을 골랐지만 그게 화근이었던 것 같다. 꼼꼼한 역주는 감동적이었지만 너무 꼼꼼해서 본문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렸고, 수많은 실례는 너무 수많아서 역시 산만해지기 일쑤였다. 차라리 분량을 확 줄인 까치의 도설판이나 한겨레출판사의 옥스포드판을 골랐더라면 조금은 나았을지도 모르겠다.
레비스트로스의 <야생의 사고>를 읽으며, 어렵기도 하고 정신적인 밀도감(?)이 너무 높아서, 관련되는 다른 책 몇권을 함께 읽으려고 독서의 전략을 잠시 수정했다. 그러나 노베르트 엘리아스의 <문명화과정>과 클리퍼드 기어츠의 <문화의 해석>은 <야생의 사고>의 보조독서로 읽을만한 심심풀이 땅콩같은 책이 전혀 아니었다. 그러리라 얕본건 아니지만 다른 문체, 다른 사고방식, 다른 정신세계를 함께 엿보는 것으로 어떤 막간의 휴식(?)을 기대했는데 판단착오. 묵직한 책 3권을 함께 읽는다는 건 세 책의 가치를 함께 떨어뜨리는 일인 것 같았다. 역시너지 효과라고 할까? 아무튼 입문자가 시도할 만한 방식은 아닌 듯 싶다. 이 책들을 읽기 전에 레비스트로스와 구조언어학에 대해 먼저 읽어보는 것이 순서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잠시 노베르트 엘리아스와 필립 아리에스 등의 아날학파 관련 저작과 레비스트로스 이후의 인류학/언어학 등의 논의에 대한 관심은 일단 접어두고 차근차근 레비스트로스를 탐독하기로 마음먹었다. <야생의 사고>는, 공부를 시작한 이후 만난, 가슴 뛰는 열정을 느끼게 하는 몇 안되는 책 중의 하나. 한번의 독서 후 '하룻밤의 지식여행'시리즈의 <레비스트로스>를 통해 좀 더 이해하고 되었고, 레비스트로스 대담집인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를 통해 아주 많은 정보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었다. 적어도 두번은 읽어야 리뷰를 쓸 수 있겠다고 생각한 다른 책들처럼, <야생의 사고>와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도 언제 두번째 독서를 하게 될지, 언제 리뷰를 쓰게 될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래서 정작 깊이 마음에 새겨진 책은 독후감을 못쓴다..ㅠㅠ)
<가까이 그리고 멀리서>를 읽은 후, <신화학1>을 읽을까 고민하다 내심 급한 마음이었을까? 소쉬르의 <일반언어학강의>를 읽기 시작했다. 소쉬르를 비롯한 구조언어학과 언어학일반에 대한 한두권의 책을 읽고 다시 레비스트로스로 돌아갈 계획인데,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 (이런 결심은 거의 90%이상 지키지 못했는데...-.-; )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는...뭐, 나도 궁금하다. ^^;;
레비스트로스 -> 소쉬르, 사르트르, 융, 프로이트, 엘리아데, 로만 야콥슨(프라하 학파)...
레비스트로스 -> 마르셀 모스, <증여론>, 루소...
레비스트로스 -> 자크 라캉...

분류 : 공부 2010. 1. 31. 19:42
제목 : 공부의 흐름 : 2010년 1월